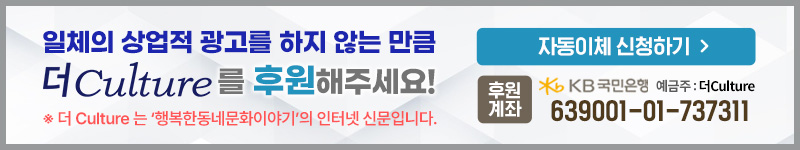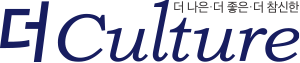3대에 걸친 우체부 가족이야기, 《우정만리》
효자고 학생 가족들과 함께 보다

일주일에 세 번 학생과 교사가 번갈아 시를 고른 뒤 필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손 글씨 시집을 모아 필사의 숲 전시회도 열었다. 여러 명이 함께 시작했으나 완주한 학생은 드물어서 그 학생들만 모아 연극관람 기회를 줬다. 가족, 친구, 선생님과 보라고 2장씩 선물로 주며, 표가 여분이 있어 어떤 학생에게는 4장을 건네줬다.
《우정만리》(이대영 작/김대기 연출)는 삼대에 걸친 우체부 가족 이야기다.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일 뿐 소식의 길흉과는 무관한 우체부임에도 결국은 역사적 사건들과 연루되고 마는 내용이 담겼다. 효자고 학생들이 친구, 모녀, 자매, 사제 심지어 가족 전체를 동반해 관람하였다.
체신부에 근무하며 첨단 통신업무를 배우려 해도 나라를 빼앗긴 민족에게는 차별이 당연시되었다. 나라를 되찾고자 목숨을 내놓고 쫓고 쫓기는 이야기 속에 삼대의 애환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체부가 그저 소식만 전하고 싶을 때는 전보를 읽어 달라 애원을 하고, 반드시 친구에게 편지를 전하고 싶을 때는 가운데서 편지만 놓고 가라고 가로막는다.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까지 물러나야할지 갈피를 못 잡으면서 우체부는 구한말, 일제강점기, 해방 후를 통과한다. 1세대 계동이 암호처럼 숫자로 쓴 편지는 과연 해독을 마쳤을까? 때로 독립군으로 몰리기도 하던 그 편지는 3세대 혜주 손에 의해 2세대 수혁에게 전달되기 위해 머나먼 여정을 떠나지만 정작 그 편지의 수신인은 혜주 자신이다. 더불어 이 연극을 보는 관객들이다.
자유연애, 사의 찬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대한매일신보, 경성방송국, 내선일체, 독립운동, 김구, 이승만 등 쟁쟁한 어휘가 쏟아져 나온다. 개인의 사랑과 우정이 국가란 대의명분 아래서 스러져만 갈 때, 나라면 어떤 삶을 선택했을까를 고민하게 했다. 그러고 보니 《우정만리》의 우정은 우체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혁의 친구인 정혁과의 우정이기도 했다. 과연 아이들은 그리고 가족들은 어떤 감상을 했을까? 궁금하던 차에 학생에게 소감문이 당도했다.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연극이라 내용을 많이 담지 못 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연극을 보며 세 번이나 눈물을 훔쳤다. 특히 마지막에 수혁의 딸이 편지를 뜯으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잊고 있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는다. 나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어느 샌가 잊고 있었다는 생각과 앞으로 나도 모르게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삼대를 걸쳐 이야기를 풀어가니 역사 속에서 멀게 만 느껴졌던 사건이 훨씬 가깝게 느껴져서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이뿐 아니라 무대와 가까운 좌석에 앉으니 배우들의 목소리와 표정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연극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가족과 차안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께선 연극 중간 중간 나오는 시를 모두 알아 스스로 놀라셨다고 하셨다. ‘아! 내가 시를 좋아하는 건 모두 유전이구나’ 생각했다. 내 동생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배운 적 있다며 이야기했다. 그리고 아빠는 나와 같은 부분에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다. 심지어 너무 우셔서 머리까지 아프다 하시니... 이것도 유전 같다. 연말에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서 기쁘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뜻 깊었다.’
어여쁜 가족에게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린 것만 같아 덩달아 나도 기뻤다. 학교 예산이 교육 주체에게 골고루 돌아갈 때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커다란 공사보다 소소한 행사가 더 교육적이란 생각이 든다. 책 읽고, 토론하고, 글 쓰고, 연극 보고, 전시회 가는 일처럼 자신의 삶을 인문학적으로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마친다.
효자고 국어교사 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