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모네, 르느와르, 반 고흐 그리고 세잔느)
여행지에서 미술관은 베이스캠프다. 비바람을 피하고 혹서, 혹한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길을 잃었더라도 미술관만 있으면 그곳이 곧 목적지로 변한다. 토끼굴에 빠진 앨리스가 되어 미술관 곳곳을 탐험할 수 있다. 볼로뉴 숲의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이 그랬고, 네덜란드 풍차마을의 잔스 뮤지엄이 그랬다. 좋은 그림 하나만 있으면 지루할 새가 없다. 논리가 필요 없이 오감으로 그림에 빠지는 일이 그림을 보는 기쁨이다.
노원아트센터에서 인상파 화가의 특별 전시가 있단 말에 설레는 마음으로 미술관을 찾았다. 뜻밖에 현수막이 보인다. 전쟁을 일삼는 이스라엘과 협업하는 전시에 대한 반대 현수막이었다. 알고 보니 이번 전시는 이스라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들이 우리나라로 나들이를 온 탓에 걸린 플레카드였다. 세상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음을 새삼 느끼면서 그림을 찬찬히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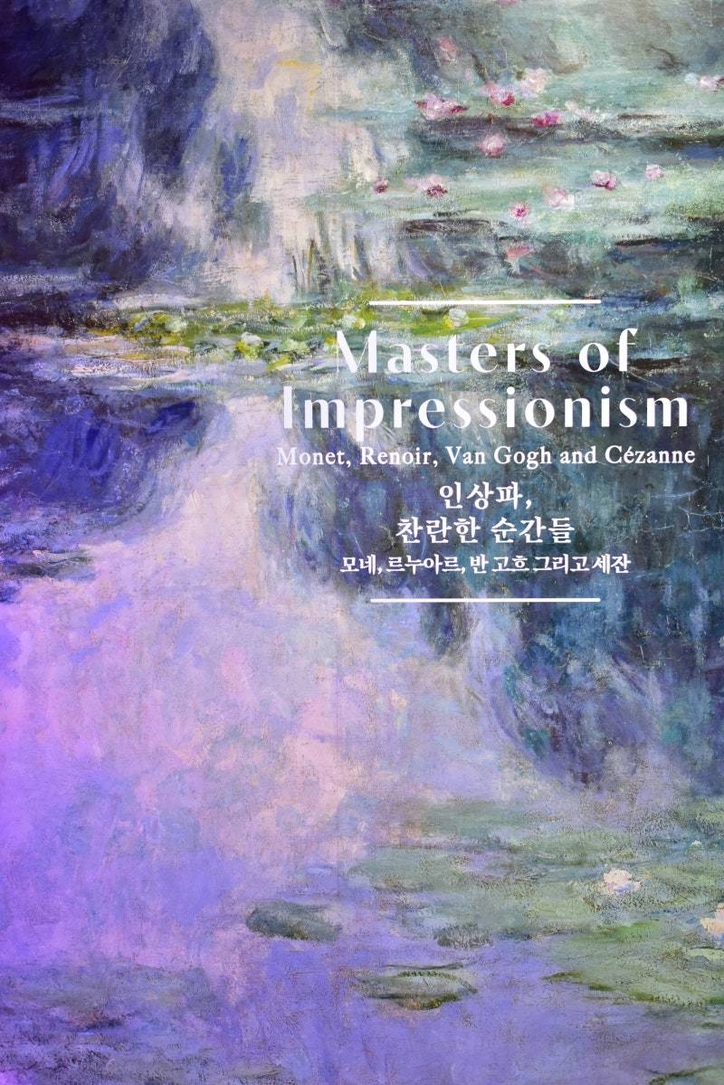
증기선, 공장 굴뚝, 증기 기관차가 이번에는 또렷이 보였다. 세느강에서 짐을 나르는 인부들은 한 눈에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나무다리를 걷고 그 뒤에는 굳건하게 증기를 내뿜는 공장이 보였다. 근대를 알리는 모습이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두 가지가 달리 보였다. 하나는 테오 반 리셀부르크의 ‘르 라방드의 지중해’였고 또 하나는 반 고흐의 ‘밀밭의 양귀비’였다. 전자는 오지호의 남향집과 겹쳤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쪽빛을 나무 그림자로 그려내어 그림자에도 빛이 있음을 표현한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그런데 ‘르 라방드의 지중해’ 역시 보랏빛 그림자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 오지호가 한국의 인상파 대가라고 불리니 그가 그린 그림이 리셀부르크와 닮았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럼에도 내 마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쪽빛 하늘이 마치 이 세상에 둘인 것만 같아 허전함을 감출 수 없었다.

후자는 ‘밀밭의 양귀비’의 강렬함이었다. 반 고흐는 렘브란트 미술관의 대표작인 유대인 신부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빵 한 조각만 먹으며 2주일 간 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면 나의 10년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것이라고.

'밀밭의 양귀비'를 보면 고흐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해본다. 붉은 양귀비가 아름다운 여성성을 보여준다면 초록 밀은 위풍당당한 남성성을 보여준다. 마치 변상벽의 '어미닭과 병아리'그림에서 바위가 남성성을 보여주듯. 자연물만으로도 약동하는 로맨스가 느껴지도록 그려낸 반 고흐! 오래도록 머물고 싶었지만 밀려오는 인파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이럴 때는 나오시마 예술섬의 지중 미술관이 그립다. 안도 다다오가 건축한 이 미술관에 가장 인기 있는 전시관은 모네관이다. 관람객을 소수로 제한하여 호젓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바닥은 흰 조약돌이 잔잔하게 깔려 소리를 흡수하게 해 놨다. 이토록 대접받으면서 명화를 관람할 수 있다니.
영상관을 지나 강당에서는 마침 세잔느에 대한 강연이 한창이다. 그가 그린 그림은 초점이 여러 개다. 원근법도 무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근대의 정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본다. 고정된 계급이 패권을 지닌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햇빛 앞에 찬란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의정부 효자고 국어교사 박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