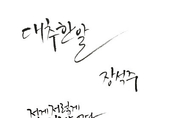
저는 ‘캘리그라피’를 그립니다. 아버지는 글자체가 아주 반듯했습니다. 누구나 잘 쓴다고 감탄을 했으니까요. 특별히 정성을 들여서 쓴 글씨가 아닌데도 글씨체는 힘이 있고 가지런했습니다.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붓글씨나 펜글씨를 따로 배우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다만 늘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글씨를 쓰는 시간을 많이 가진 덕분에 좋은 필체를 가지게 된 듯 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좋은 필체로 손 편지를 자주 쓰기도 하셨죠. 가족과 친척들에게 가끔 편지를 보내곤 하셨습니다. 집을 떠나온 딸을 걱정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내 주셨지만, 아버지의 편지에 직접 손 편지로 답장을 해 드린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전화로 편지를 잘 받았다고만 했던 적이 더 많았으니까요. 글로나 말로나 정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늦은 후회를 합니다. 아버지의 좋은 글씨체를 보면서 살아온 것이 내게는 글씨를 잘 써야 한다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씨를 반듯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글씨를 잘 쓰려면 붓글씨를 배우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듯했습니다. 글씨체만 멋있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붓글씨를 배우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

엄마, 병아리를 키우면 안 될까요? 유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손에 노랑 병아리 한 마리를 들고 왔다. 우리도 어릴 적에 학교 앞에서 노랑 병아리를 보곤 했는데, 아직도 그런 일이 있나 싶어 의아해 하면서 “병아리는 왜 데리고 왔어?”라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 학교 앞에서 샀던 병아리를 키워 닭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작은 두 손으로 병아리를 조심스레 싸안고 온 유진이를 보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병아리 따위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느껴지는 무심한 말투와 목소리 톤이 좀 높아진 소리에 유진이가 더 놀라서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사실은 작은 병아리라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생명이라고 여겨져서 애잔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조심스레 병아리를 살피면서 생사부터 확인을 해야 했다. “병아리가 살아 있기는 살아 있어?” “네, 살아 있어요. 삐약 삐약 소리를 내기도 해요.”라면서 병아리를 데리고 온 사연을 들려주었다. 친구인 지수가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샀다고 했다. 한 마리만 사려고 했는데, 한 마리 값으로 두 마리를 주었다고

‘한·일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30여 년 전에 일본 동경에서 1년 반을 지낸 적이 있다. 그때도 나에게 길을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 내 외모가 일본 본토 사람처럼 보였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고 묻길래 당황을 했다. “저는 일본 사람이 아니어서 길을 잘 모릅니다”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서곤 했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가끔 일본 사람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해요?”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나의 한국말 발음이 서툰 것인지? 진짜로 외모가 일본 사람처럼 생겼는지 모를 일이지만, 그런저런 연유로 일본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하는 이유가 많았다. 일본에서 잠시 살았던 인연으로 일본 사람을 만나면 괜히 반가워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더 친절을 베풀고 싶어지기도 한다. 작년 외교부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2022 ‘한일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공모전에 응모를 했는데 상을 받게 되었다. 공모전 소식을 듣고, 떠오르는 일본 친구들이 많았다. 서울 종로에서 10여 년간 한옥게스트하우스인 유진하우스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일본 사